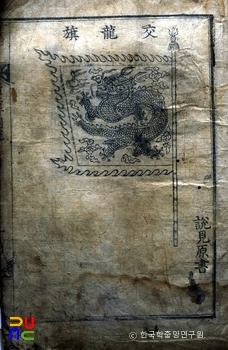카지노리거 노적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카지노리거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추수 후 농가의 마당이나 넓은 터에 원통형으로 쌓아두는 곡식단.
내용
대개 볏단이나 보릿단·조단 등이며, 황해도·평안도에서는 낟가리라고 하며, 경기도 이남에서는 노적 또는 노적가리라고도 한다.
거두어들인 벼·보리·조는 탈곡해서 섬에 담거나 도정하여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들인 곡식은 탈곡이나 도정을 일시에 할 수가 없어 곡식나락을 노적으로 쌓아 보관하게 된다.
노적을 쌓을 때는 곡식알이 붙은 쪽을 안으로 하고 뿌리 부분을 바깥쪽으로 하여서 곡식단을 포개어 원통형으로 2m 정도로 쌓고, 그 위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게 삿갓 모양으로 엮은 덮개를 씌워 장기간 두게 된다. 노적은 농가의 마당이나 광장에 쌓아놓는다.
노적은 그해 안으로 모두 다 탈곡하여버리는 것이 원칙이나 탈곡할 곡식이 많을 때에는 여러 해 묵히게 되는 수도 있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던 옛날에는 한 집안의 부(富)를 곡식의 수량으로 평가했다. 백석꾼·천석꾼·만석꾼의 말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서 노적 수의 많고 적음도 부를 평가하는 상징이 될 수가 있었다. ‘노적에 나비난다.’는 말이 있다. 노적을 탈곡하지 못하고 해를 묵히면 벼알에서 바구미가 생겨 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노적에 나비가 난다는 말은 그 노적 임자의 부력을 비유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말이다. 근래에는 아무리 대농이라도 노적을 쌓지 않는다. 탈곡기로써 단시일내에 탈곡하기 때문이다.
관련 카지노리거
(1)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