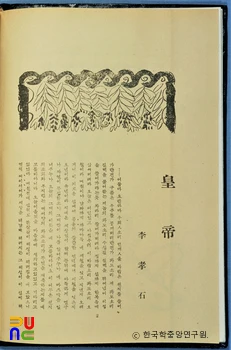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황제 ()
‘나’는 사람을 죽이는 땅이자 꽃들이 시들어 버리는 땅에 귀양을 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특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신을 나폴레옹 황제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나파르트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769년 8월 15일 태어나 1803년 5월 18일 황제로 옹립된 ‘나’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구라파 전 지역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배지에 묶여 병약해진 ‘나’는 프랑스 센느강 언덕에 묻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무도한 백성들에 의해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지난 영광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나’는 알렉산더와 시저처럼 하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쓸쓸하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 고향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린다. 이어 첫 번째 아내였던 조세핀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루이스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소식을 알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들을 생각할 때 ‘나’는 황제도 영웅도 아닌 한 사람의 범상한 지아비일 뿐이라고 자인하고, 조세핀에 이어 자신이 만났던 일곱 명의 여성을 차례대로 회상한다. 이어 혁명으로 루이 16세가 몰락한 뒤 파리 주둔병 사령관을 거쳐 이탈리아 전역으로 원정을 떠나 승승장구한 뒤, 2년 동안의 원정을 마치고 개선하여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때를 반추한다. 제일통령에 이어 황제가 된 뒤 일가의 형제들로 하여금 구라파 전역을 다스리게 하여 전 유럽의 맹주가 되었다가 몰락의 과정을 겪고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하였으나 영국 함에 잡혀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리며 ‘나’는 비탄에 젖는다.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한편 일생의 마지막에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영웅의 말로이자 황제의 최후가 너무나 비천한 것을 한탄하던 ‘나’는 원통해하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가면서도 탄환이 자신을 뚫을 수 없으리라고 믿는다.
이 소설은이효석이 『문장』1939년 7월호에 발표한 단편소설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통해 나폴레옹의 전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소멸된 시점인 죽음의 순간에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방식의 서술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유배지에서 죽음을 앞둔 나폴레옹이 과잉된 자의식 속에서 자신의 몰락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효석은 이 소설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인 황제의 목소리를 통해 유럽 정복의 야망을 지닌 나폴레옹의 비극적 생애에 대한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말 제국 일본의 대륙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